[소중한 것을 점차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해나가 있던 자리
“여행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에 곧잘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지요.
“여행에 참 목마르시나 봐요.”
마지막 여행이 언제인지,
낯선 곳에 나를 던졌던 때가 언제인지,
‘재생과 반복’ 속에 갇혀 있던
요즘의 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려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허전함’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필요한데
내가 그 자리에 없거든요.
나를 잃어버렸지만
타인 속에서 기어이 하루하루를 사는 지금,
상실의 아픔과 인생
그리고 사랑을 오롯이 담아낸
소설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만든 옷들은
나를 충분히 먹고살게 해주지만,
인생이라는 선반에는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더 늦기 전에 그걸 채워 넣지 않으면, 영원히
선반에 음식만 채워 넣다 끝날 것 같아 두려웠죠.
인생이란 선반이 냉장고가 되어선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선반을
냉장고보다는 책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두툼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장서들이 꽂힌 책장이요.”
-오소희 <해나가 있던 자리> 중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쳐 놓고
저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살아서 벌어지는 일은
다 축복이란다’ 라는
이야기 속 한 줄을 가슴에 새기며
인생이라는 선반을 채울 겸,
나를 찾을 겸
나.는. 떠.납.니.다.
해나, 그녀처럼.
여행작가 오소희의 생애 첫 번째 소설, 해나가 있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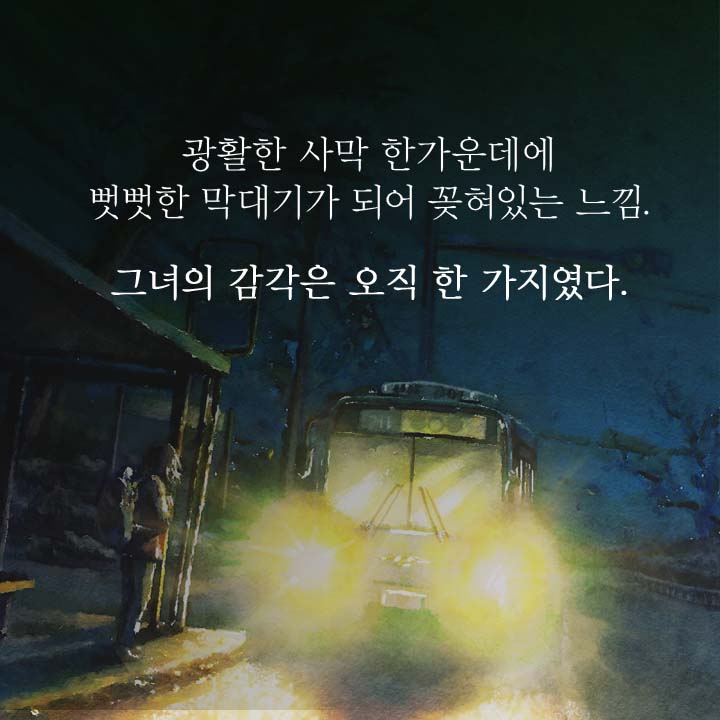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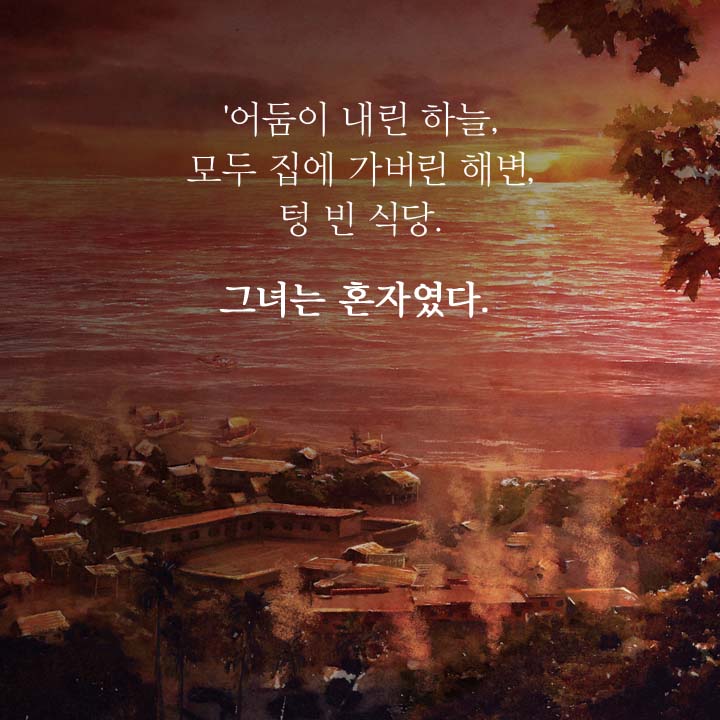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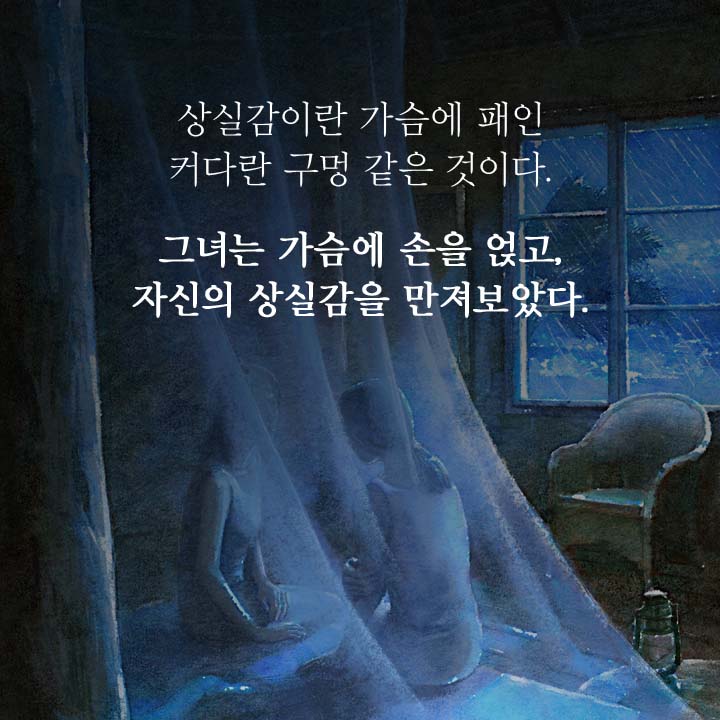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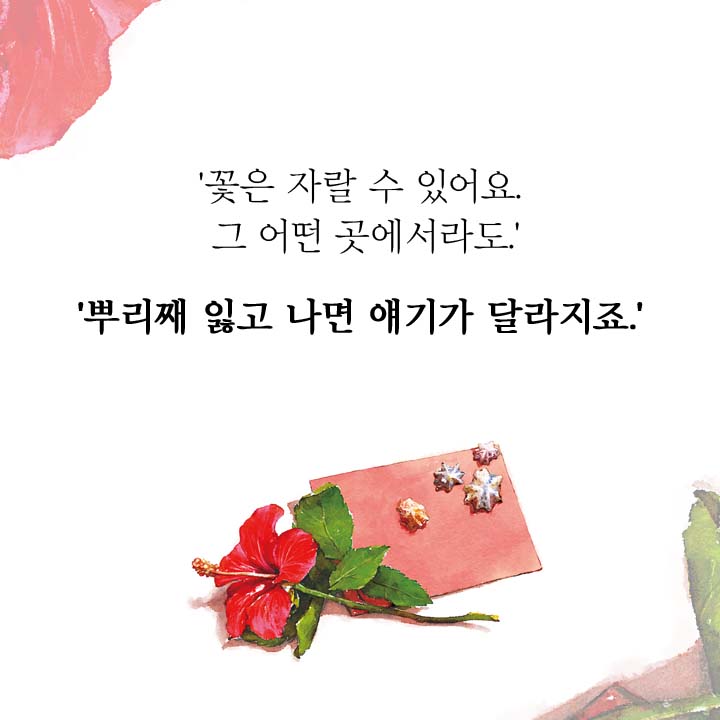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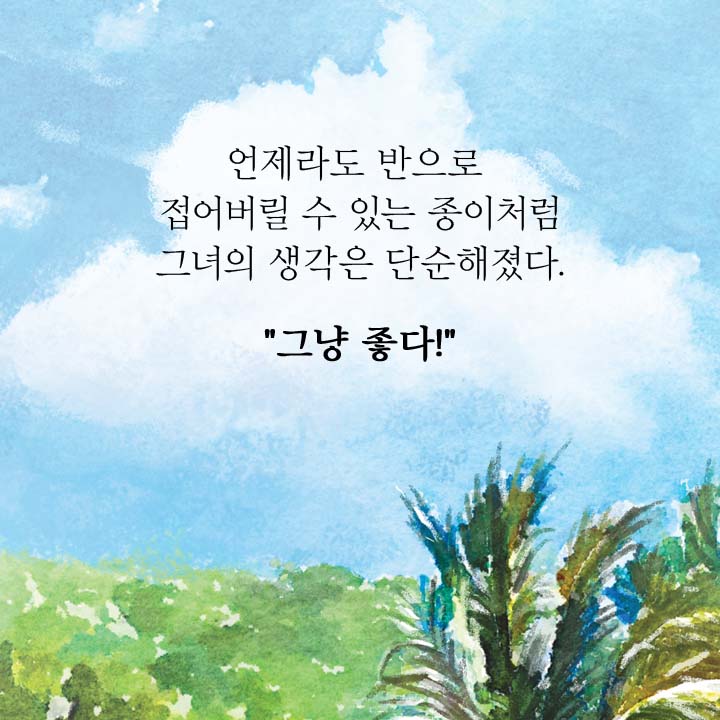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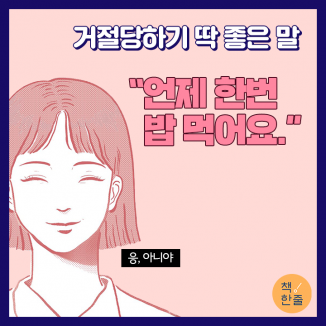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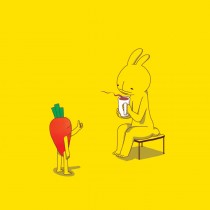

![[한줄테마] 욕심 없는 사랑이 필요한 당신에게](http://www.bookhz.com/wp-content/uploads/2015/01/l1-210x210.jpg)
![[신간테마] 그것이 알고 싶다](http://www.bookhz.com/wp-content/uploads/2015/01/00-210x210.jpg)


